'누구에게나 똑같이 밤은 오지만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' 하고──,
어딘가에서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겠지만, 지붕 위에서 빛나고 있을 별들에 대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. 그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, 그렇게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밤은 형광들의 불빛 아래서 보냈다.
항상 밤은 독서의 시간이었다. 하루 일과가 끝나기 직전, 푹신한 의자 옆에 책이 있으면 마음이 놓였다. 창 밖은 어두웠지만 침대 옆 조명 불빛이 비추는 작은 영역 안에, 차가운 종이와 빼곡히 채워진 작은 글자들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었다. 그 모습은 꽤나 큰 하루의 위안이 되었었다고 생각한다.
상당히 시간이 흘렀지만 뭐──,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그다지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한다.
다만, 지금은 어찌어찌 가끔 별을 보러 망원경을 들고 나가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가슴 한 켠에 있을 뿐이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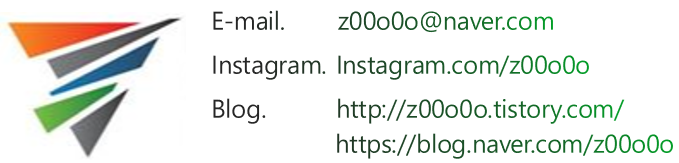
'[사회][인문] - Humanities > 수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에세이]거울의 반대편 (0) | 2022.03.09 |
|---|---|
| 풍선껌은 단물이 빠지고부터 진짜 시작 (0) | 2021.07.06 |
| 이세계물에 대하여 (0) | 2020.03.02 |
| [DIARY] 20.02.27 (0) | 2020.02.27 |
| 빈 수레가 요란하다 (0) | 2020.02.25 |



